1990년대말에서 2000년대 초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 ANT)과 신유물론과 같은 새로운 동향이 나타났다. 이는 근대화와 근대화의 기반인 이원론에 대한 비판과 관련이 깊다. 인간과 사회 현상의 이해와 관련하여 어쩌면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ANT와 신유물론은 많은 공통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그동안 당연시 되어왔던 이분법적 인식론을 거부하는 것이다. 인간/비인간, 사회/자연, 주관/객관, 가치/사실, 거시/미시 등 경계를 구분 짓는 것을 거부하고, 사회를 인간-비인간의 복합체(collective)로 본다. 이분법적으로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은 한쪽의 우위를 전제하며, 존재의 풍부한 의미를 간과하게 만든다. 인간과 비인간을 차별하지 않으며, 이분법적인 존재를 해체했을 때야 비로소 그동안 간과되었던 존재들의 풍부한 의미를 포착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신현정 외, 2022).
ANT에서 Actor(행위자)는 인간과 비인간(non-human)을 모두 포함한다. 비인간은 용어 그대로 인간 행위자(human)가 아닌 행위성을 지닌 다른 모든 행위자를 지칭한다. 어떤 행위자가 의도나 의지, 동기를 갖추고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을 행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등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행위성을 지닌 행위자라고 설명한다(Latour, 1987; Latour, 1990). 물질도 행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는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 교육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비대면 교육의 도입, 교사의 수업에서 역할 변화, 학생의 행동 변화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물질과 인간이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는 관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즉 인간 만이 행위성을 가진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ANT에서 네트워크는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를 포함한 이질적인 연결망 개념이다. 행위자는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 네트워크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며(박경환, 2013), 이 세계 속의 모든 존재는 자신이 맺는 관계에 따라 존재의 속성이 달라지는 역동성을 갖게 되므로 개방적이고 복잡하고 우연적인 성격을 가진다(김환석, 2020). 행위자의 행위능력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숱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관계적 효과로 본다. 네트워크는 완성된 결과이기보다는 사회적 궤적이며 유동적이며 수행적인 상태에서 존재한다(Latour, 2005).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을 잘 작동시킨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에 비해 더 큰 권력을 얻게 된다(홍성욱, 2010).
교육이라는 세계 역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집합체로 구성된다.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행위자들의 접속과 부딪힘을 통해서 교육세계의 네트워크가 생성되고 허물어지고 다시 건설되기를 반복한다(김진택, 2012). 또한, 인간 행위자의 역량은 그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생이 인간 또는 비인간 행위자를 자신이 가진 네트워크에 편입시켜 얼마나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이중원, & 홍성욱, 2008). 이와같은 새로운 이론적 관점은 기후 위기나 교육 현상의 이해에서 인간 뿐 아니라 비인간/물질의 행위성까지 포괄하는 더 큰 시각과 심층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천역량 함양, 시민과학자 프로그램과 같은 기후 변화 대응 실천역량에 대한 우리 연구진의 이전 연구를 되돌아보면 모두 실천적 관점을 중심으로 인간과 인간의 행위성에 초점을 두어왔다. 시민과학 동아리 프로그램 연구에서 테크놀로지가 탐구 활동과 실천에 미치는 기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이를 배경에 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행위성을 균형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테크놀로지 기반 시민과학 활동을 ANT를 기반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비인간인 테크놀로지의 행위성까지 탐색하는 좋은 맥락일 것이다. ANT는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지만, 교육 현상에 이를 적용한 선행 연구도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테크놀로지 활용 시민과학 동아리 프로그램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행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학생들과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가? 둘째, 시민과학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네트워크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임성은, 2023). 연구는 서울시 소재 H초등학교 5학년 1학급에서 실행되었다. 담임 교사와 학생 21명이 참여했다. 4단계로 이루어진 총 24차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진행되었다. 4단계는 0단계 준비, 1단계 시민과학과 테크놀로지 이해, 2단계 탐구, 3단계 사회적 행동이다(그림 1).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가석현(2021)이 개발한 것을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수정하였다. 현장 관찰, 반구조화된 면담, 활동 자료, 교사 성찰일지, 참여 관찰일지 등과 같은 다원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임성은, 2023).

첫번째 과제는 학생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형성은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행위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ANT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과정을 ‘번역(translation)’이라고 한다(Law, 1992). 여기에서는 칼롱(Callon, 1986)의 번역 단계를 사용하였다. 칼롱의 번역은 문제 제기, 관심끌기, 등록하기, 동원하기의 4단계로 되어 있다. 문제 제기에서는 기존 네트워크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무통과정(OPP: obligatory passage point)을 설정한다. 의무통과점은 이를 둘러싼 동맹이 행위자 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이 특정한 행위 지점을 의무적인 것처럼 통과하여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은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순종하기보다는 까다롭게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김환석, 2012). 관심끌기는 기존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를 분리시키고, 새 네트워크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등록하기는 행위자들 사이의 새로운 역할을 정의하고, 조정하고, 재정의한다. 동원하기는 대표성을 가진 행위자가 생성되는 과정이며, 그 행위자는 새로운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다른 영역으로 확장된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번역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주 행위자는 연구자, 디지털 테크놀로지, 교사, 학생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번역의 과정에 참여하여 동맹을 구성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OPP를 통과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참여 교사는 OPP를 수정하게 되었다.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 실패하는 참여자들이 많아서 초기 OPP를 달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모둠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둠 내에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를 형성한 누군가가 있으면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다. OPP 수정으로 학생들의 목표인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해와 활용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가능하게 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단계별로 참여에 성공하기도하고 실패하기도 했다. 이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그림 3). 사례 1은 STEP1은 실패했지만, 즉 디지털 테크롤로지와 동맹을 맺지는 못했지만 이후 단계에서는 성공적 참여를 한 학생이다. 반면에 사례 2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동맹에는 성공했지만 탐구와 사회적 실행에는 실패한 경우이다. 사례 3은 모든 단계를 성공한 경우이며, 사례 4는 모든 단계에 실패한 경우이다.

사례 1에 해당되는 최지아 학생을 중심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 형성을 요약한 것이 그림 4이다. 바탕색은 네트워크의 의미 단위이다. 이 학생은 STEP1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관련 행위자인 엠블럭, 센서,허큘러스, 노트북, 구글과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화하였다(노란색 바탕). 반면 띵스보드와 관련된 녹색 영역의 행위자들과의 연결은 안정적으로 변화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패는 이 학생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관계망 전체를 흔들었다. 최지아는 안정적 관계망 구축을 위해서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교사, 보조교사, 연구자와 관계 맺기 전략을 강화하였다(파란색 바탕). 이를 통해 노란색 바탕의 관계는 더 안정적으로 변했으나, 녹색 바탕(띵스보드)의 관계 형성 어려움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 형성을 하게 된 후 학생들은 소집단으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사회적 행동를 계획하였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궁금했거나 문제의식을 느낀 주제로 시작하였으며,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탐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탐구주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측정 결과에 따라서 계속 수정되고 변경되기도 하였다. 사례 1이 포함된 모둠의 탐구 활동은 그림 5의 두 개의 보라색 바탕 연결에 잘 드러나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 안정화에 비교적 성공한 영훈, 우진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VR실, 운동장에서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였다. 반면 테크놀로지와 안정화를 이루지 못한 지아와 유빈은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탐구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노란색 바탕 부분은 이 모둠의 탐구 주제가 엘리베이터와 운동장의 미세먼지 비교에서 VR실 운동장의 이산화탄소의 비교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며, 주로 영훈과 우진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영훈과 우진의 측정 결과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실시간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그래프(그림 5의 중앙 하단)로 전환되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서로 단절되어 있던 이 모둠 내 두개의 활동은 그래프라는 기입물을 통해서 모둠원 전체의 활동으로 전환되었다. 기입물은 어떤 기기를 거친 물질이나 실체가 숫자와 그림과 도표, 도식과 그래프로 변형되어 인간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변한 것이다(홍성욱, 2010).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것, 컴퓨터 프린트 아웃, 실험실 노트 등이 해당되며, 토론, 해석, 동원을 가능하게 만든다. 기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고 만들어지며 제조되는 것이다. 기입은 어떤 실체와 관련되면서 그 실체에 이름이 주어지고 정체성이 부여되며 행위 형태가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담론의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Callon et al., 2009). 모둠원들은 그래프를 접하면서 놀라는 감정을 드러내고, 그래프가 변화하는 이유를 함께 추측하고, 새로운 탐구 활동을 추가로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새로운 변인 통제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학습 네트워크 안정화를 나타냈다. 또한 개인에게 주어진 모둠 내 주어진 역할(이끔이, 측정이, 기록이, 꾸밈이)과 연결을 끊어내기도 하였다. 다음은 이를 보여주는 대화 장면이다(임성은,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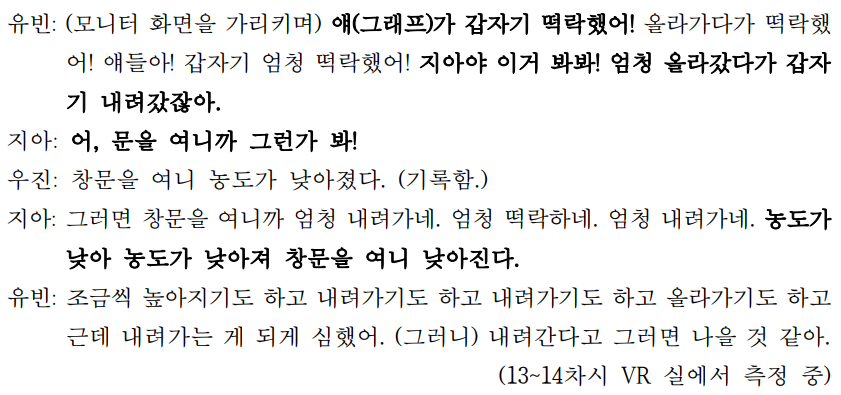
이 모둠은 사회적 행동 시작 단계에서 다시 탐구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다. 탐구주제는 처음에는 '운동장과 엘리베이터 미세먼지 비교'였다. 그 후 '운동장과 VR실 이산화탄소 비교'로 변경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창문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이산화탄소 비교'로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탐구와 사회적 행동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탐구 주제 변경에 소극적이었던 유빈과 우진의 네트워크는 약화되었다. 한편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영훈의 행위성은 모둠 내의 역할이었던 '측정이'를 끊고 확장되어서, 측정을 마친 후 사회적 행동 준비를 위하여 이산화탄소 관련 자료 검색 등을 수행했다(그림 6). 지아는 사회적 행동을 위하여 영상 제작 및 홍보를 희망했으나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를 포기하고 포스터 작성으로 선회하였다. 이 들이 만든 포스터에는 탐구 활동에서 조사한 풍부한 내용이 거의 담기지 못하고 환기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게 되었다. 시간이라는 비인간이 영상만들기를 거부하도록 촉발하는 행위성을 드러냈다.


그림 7은 이 모둠의 사회적 실천으로 작성한 포스터이다. 이 포스터는 교내에 게시되었으나 일주일이라는 제한된 게시 기간과 설명절 휴일과 겹쳐서 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는 노출되지 못하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공유되고, 반응을 받는데 그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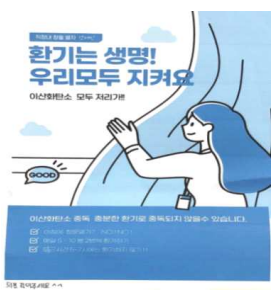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사례 1 외에도 다른 사례들이 있었으며, 사례에 따라서 다른 네트워크 형성과 변화 과정을 보여주었다(임성은, 2023). ANT 기반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화가 유동적이고 수행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술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학생들의 네트워크 형성 과정 역시 개인에 따라 다양했다. 여러 행위자들의 서로 다른 목표를 감안한 OPP 설정을 통해서 학생들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 안정화 시도는 부분적인 성공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제시한 사례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복합적인 특성(센서, 엠블럭(SW), 허큘러스(SW), 노트북컴퓨터, 구글, 띵스보드 등)을 보여주며, 모든 구성요소와 두루 네트워크 안정화 이루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보교육이 시작되었지만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 안정화는 초등학생에게는 쉽지 않음도 보여준다.
디지털 테크놀로자와 네트워크가 안정화되면 인간-디지털 테크놀로지 하이브리드로서 실시간으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농도 변화와 연결되는 행위성을 발휘하며, 실시간으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농도와 연결되어, 탐구 문제에 대한 자료 수집과 장소를 바꾼 측정을 통한 새로운 문제 발견으로 이어진다. 때로는 탐구 문제의 빈번한 변경으로 활동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소집단 활동의 경우 소집단 수준의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 안정화를 통해서 시민과학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소집단-비인간의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로서 행위성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집단 내 개인별 네트워크 안정화 차이로 인한 역할의 차이와 분업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기입물은 세상(이산화탄소)-그래프(기입물)-담화(토의)를 통해서 소집단 내 네트워크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새로운 이론적 렌즈를 기반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기후변화 시민과학 활동을 탐색하였다. 익숙한 인간 중심 렌즈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육 현상을 새롭게 보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비인간이 우리 생활과 교육 현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I를 비롯한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인간-비인간 하이브리드의 등장과 새로운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기후 위기 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웰빙을 추구하며, 과학적 이해와 사회적 실천의 두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탐구와 실천 과정에서 다양한 복합적 행위자가 포함되며, 다양한 네트워크 안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준비 및 실행이 중요하다. ANT 관점은 이를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출처
임성은 (2023).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시민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한 초등학교 수업 분석: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기반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고문헌
가석현 (2021).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실천지향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기술 구성, 교사의 기술 관련 어려움, 학생의 환경과학 행위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진택 (2012).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이해 와 적용: 공간의 복원과 재생에 대한 ANT의 해석. 인문콘텐츠, (24), 9-37.
김환석. (2020). 인간관계의 사회학에서 인간-비인간 관계의 사회학으로. 경제와 사회, 266-273.
박경환. (2013). 글로벌 시대 창조 담론의 제도화 과정: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2), 31-48.
신현정, 임성은, 강다연, 김찬종. (2022). 청소년 기후 시위에 대한 현 상학적 연구: 신유물론적 관점을 토대로. 환경교육, 35(1), 82-109.
이중원, 홍성욱 (2008). 필로테크놀로지를 말한다. 서울: 북하우스.
홍성욱. (2010). 인간・사물・동맹. 강원: 이음.
Callon, M. (1986).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en of St Brieuc Bay. London, England: Routledge.
Callon, M., Lascoumes, P. & Barthe, Y. (2009). Acting in an uncertain world: An essay on technical democrac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Law, J. (1992). Notes on the theory of the actor-network: Ordering, strategy, and heterogeneity. Systems Practice, 5(4), 379-393.
Latour, B. (1987).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Latour, B. (1990). On Actor-Network Theory. A few clarifications plus more than a few complications. Philosophia, 25(3), 47-64.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지구)과학 교육 연구가 긍금해? > 기후변화 교육 KGU2023'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후 위기와 학교 시민과학 동아리 활동 (0) | 2023.08.27 |
|---|---|
| 기후 위기와 시민과학교육 (0) | 2023.08.22 |
| 기후 위기와 교육 분야의 동향 (0) | 2023.08.19 |
| 기후 위기: 현상, 현대사회, 교육적 전환 (0) | 2023.08.19 |
| 기후 위기 교육의 목표 탐색 (0) | 2023.08.04 |



